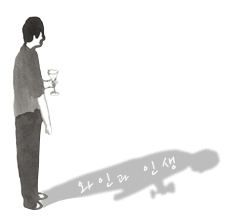 |
|
|
|
|
필록세라가 유럽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1863년이었지만 그 목격 장소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영국 런던의 고급 주거지 해머스미스에서 관상용 포도나무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필록세라가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 아비뇽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와인상이 "미국의 친구"로부터 받은 묘목에 붙어 따라 왔다는 주장도 있다. 혹시 이것은 인디언의 복수?? 유럽인의 횡포에 신음하던 인디언들을 위해 필록세라가 대신 해준 복수?? 어쨌든 이 마음씨 좋은 미국 친구를 둔 박복한 양반의 포도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무에 벌레의 공격을 받은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 해 더 많은 나무가 공격을 받았고, 1865년이 되자 수 km 떨어져 있는 포도원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 공격 이후 5년 내 프랑스 남부의 수많은 포도원이 쓰러져갔다. 곧 이어 필록세라가 눈에 띄자마자 밭을 몽땅 갈아엎은 독일만 빼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나머지 지역이 필록세라의 거센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 참 대단한 일 아닌가? 하나의 대륙 안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빨리도, 세차게도 퍼졌다. 안 그래도 허덕이고 있던 포도원들을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1939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이었다. 제 목숨 하나 살피기도 힘든 판국에 포도원까지 세심히 신경 쓸 겨를이 있었을까? 포도원은 더욱 황폐해졌다. 여기에서 또 독일 와인의 앞길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다. 전쟁 후 대규모 포도원 재건 사업이 시작되어 거의 모든 포도나무가 뮐러-투르가우라는 품종으로 교체되고, 이를 기반으로 저렴한 세미 스위트 와인이 대량생산된 것이다. 덕분에 와인 업계는 살아났지만 독일은 달달한 싸구려 와인만 생산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그러니 포도밭을 갈아엎는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시 이 끈질긴 기생충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할 수 있겠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도 필록세라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도대체 왜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일까? 죽은 나무를 파보면 검게 변해 썩어버린 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건강한 나무를 파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바로 아래 뿌리에서 우글거리고 있었을 텐데!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상금이 내걸렸다. 토양에 화학약품을 주입했다가 애꿎은 일꾼들만 픽픽 쓰러졌다. 나무 아래에 살아있는 두꺼비를 묻는 등 기상천외한 "민간요법"도 횡행했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던 중 진짜 성공적인 방법이 하나 나왔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을 침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이 가까이 있거나 지면이 평평한 포도원에서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중부에 거대한 운하 건설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은 물 건너갔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는 낮은 담이 둘러쳐진 포도원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낮은 담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침수시킨 흔적이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한낱 기생충이 와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왜 그리 중요한지? 참 흥미로운 일이다. 크기가 1mm도 채 안 되는 녀석들이 거대한 유럽 대륙의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와인이라는 사회, 문화, 종교적 대표 상품의 미래를 결정했다니. 그럼 필록세라 이후 와인 세계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계속해서 지켜보자. |
|
 2008. 10. 10. 12:19 Trackback Comment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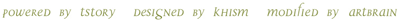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