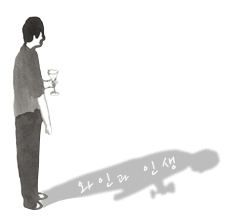 |
|
|
|
|
"필록세라?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고개를 갸우뚱, 아련한 기억을 더듬느라 머리 구석구석을 뒤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니면 조금 알긴 아는데 그 깊이가 성에 차지 않아 마치 손닿지 않는 곳이 가려운 사람마냥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속 시원히 알아보자. 필록세라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소위 "와인 세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작지만 강력한 생명체는 본디 북미의 온화한 동부와 남부에 자생하던 야생 포도나무, 일명 아메리칸 포도나무에 살고 있었다. 영국 등지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마음대로 그 땅을 꿰차고 눌러앉기 전까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필록세라 역시 숙주인 포도나무와 함께 진화하면서 오랜 세월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무의 잎과 뿌리에 살면서 때로는 나무를 약화시켰지만 수천 년을 함께 한 야생 나무 중 일부가 이 해충의 피해를 견딜 수 있게 점차 변한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해 서로 익숙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웬수 덩어리"임에는 분명한 부부 사이 같다고나 할까? 게다가 아메리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은 필록세라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특정 뿌리에 아예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필록세라가 더 맛있는 수액을 찾아 이 나무 저 나무 헤매느라 번식 속도가 느려지게 만든 것이다. 또한 뿌리에 함유된 어떤 성분이 애벌레를 죽이거나 최소한 성장을 늦춘다는 설도 있다. 요컨대 아메리칸 포도나무의 뿌리는 양분 섭취나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생충에게 불편한 곳임에는 틀림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 같은 몇몇 지역은 포도원을 세울 목적으로 만든 도시였다. 초기 이주민들은 울창하게 우거진 야생 포도나무를 발견했고 이것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유럽 와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형편없이 느껴졌던 모양이다. 고향의 맛이 그리웠던 이들은 결국 유럽의 비니페라 품종을 수입, 그것으로 와인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짐작했겠지만 역시 실패였다. 소테른의 스위트 와인에 꽂혀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맛난 와인을 만들 수 없을까" 한탄했다는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은 이탈리아의 포도 재배 전문가를 초청해 자기 땅에 포도원까지 만들게 했단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메리칸 품종과 비니페라 사이의 교배 품종이 생겨났고 다른 질병이나 필록세라에도 어느 정도 저항력을 보이면서 비교적 맛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가 개발되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모두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와인이 탄생하기까지 꼭 빠질 수 없는 뒷이야기니까. 그리고 2탄을 기대하자. |
|
 2008. 10. 9. 11:20 Trackback Comment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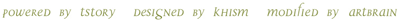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