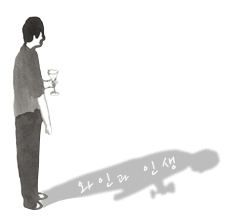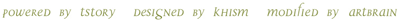본명: 떼루아/테루아 Terroir
생년월일: 와인이 탄생한 그 순간
출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구대륙.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 기세가 무척 세다.
인상착의: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밭의 토양 및 기후를 가리키는 말로써 그 와인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 주 요소
한 마디로 샤블리가 샤블리이고, 생테밀리옹이 생테밀리옹이고, 키안티가 키안티인 이유.
책 <떼루아>의 저자 제임스 E. 윌슨 왈, "그 진정한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떼루아에는 포도원의 몇 가지 물리적 환경인 포도나무, 토양, 입지, 배수, 소기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이 가능한 생태 환경 외에도 부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포도원의 역사에 포함된 모든 기쁨과 슬픔, 자부심, 노력, 그리고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 라이벌: 최신 과학 기술과 끊임없는 와인 개선 노력을 무기로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신대륙(특히 미국, 호주 등) 포도 재배자 및 와인 생산자들.
구대륙 와인이 그들만의 명성이나 높은 가격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의 떼루아(즉, 전통)다. 그 오랜 세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와인 애호가들이 와인을 선택하거나 시음할 때 자연히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와인을 시음할 때 산도가 높고 산뜻하며 드라이한 와인을 "플린티 flinty(돌과 같은 광물 풍미가 느껴짐)"하거나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그것이 부싯돌이나 광물 함량이 높은 토양의 지역과 포도원(예를 들어 샤블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와인일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포도나무가 자라는 동안 광물의 향과 맛을 빨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를 넌지시 비추고 있는 셈이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의 어느 시음회에서 다양한 돌덩이를 와인 속에 담가 "돌 풍미를 집어넣은" 와인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과연 "돌/무기질" 풍미가 와인에 스며들었을까? 아니다.
그럼 와인에서 느껴지는 "금속성", 혹은 "무기질"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와인 속에 철이 함유되어 있거나 철 맛이 첨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와인 과학 Wine Science》의 저자 제이미 구드는 그러한 광물성 풍미가 발효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으며 황 화합물이나 환원 양조 기법(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공기가 차단된 용기에서 발효나 숙성이 이루어져 산소나 오크와 같은 외부 영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법)에서 나온 것이지 떼루아의 특성이 전혀 아니라고 하였다.
떼루아라는 말은 와인 생산지로서 그 지위가 확립된 일부 지역의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써 그 정도 중요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프랑스 샤블리는 50년 전에 500헥타르에 지나지 않던 것이 오늘날 4,300헥타르까지 넓어졌다. 그럼 샤블리 포도원의 특성인 키머리지안 토양이 자동적으로 같이 확장되었나? 그래도 재배자들의 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샤블리라는 이름은 끝까지 지켜졌다. 맛도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았다. 보르도의 예를 들어보겠다. 보르도의 포도원 중 일부 최상급 포도원(예를 들어 샤토 라피트 로쉴드)들은 1855년 등급 분류를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훨씬 큰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떼루아"가 울타리 몇 개를 뛰어 넘어 마법처럼 확장되기라도 한 걸까? 전통의 떼루아라고는 자랑할 수 없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와인이 그래서 완전히 형편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유명한 1976년 "파리의 심판" 사건을 보라. 신대륙 와인도 구대륙 와인을 얼마든지 이긴다.
그런데 떼루아 없는 와인 세계를 부르짖던 신대륙 재배자들도 이제는 "나파Napa"나 "쿠나와라Coonawarra" 같은 이름을 쓸 권리를 가지고 티격태격 난리다. 떼루아냐, 비(非)떼루아냐, 그것이 문제로다.
출처: Stephen Skelton MW <Vit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