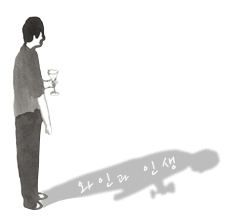 |
|
|
|
|
1편에서 어렵사리 구한 "무통 마이어"를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한국으로 돌아온 강태민(김주혁). 그의 보스는 와인을 잃어버렸단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사람을 시켜 집을 샅샅이 뒤지게 하더니 결국 태민을 물류창고로 발령내 버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숨을 거둔 태민의 삼촌. 그가 무척이나 따르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슬픔에 빠진 태민이 삼촌의 집을 찾아가서 발견한 것은 둘이 함께 병입(甁入)하고 강태민이라 이름 붙인 와인.   추억에 잠겨 그 와인을 오픈한 강태민. 쓰윽 향을 맡아보고 한 모금 마셨는데, 앗! 표정이 일그러진다. 80년대에 병입하였으니 아무리 짧아도 20년 가까이 병 속에서 잠자고 있던 와인. 오, 20년이나 되었으면 완전 좋은 와인 아냐??   그 와인은 어떤 상태였을까? 먹어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오랜 세월 조금씩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되어 식초로 변했을 것이다. 포도로 만든 식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와인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 바로잡고 싶다. 와인은 기본적으로 만든 후 신선할 때 빨리 마시는 술이다.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좋은 와인이 아니고, 아무 것이나 오래 숙성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 숙성하여 훌륭한 와인이 될 잠재력을 지닌 와인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장기 숙성하면 좋은 와인도 보관을 잘못하여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다. 포도 품종에도 장기 숙성에 적합한 종류가 따로 있고 양조 방식이나 와인의 스타일에 따라 숙성 가능성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와인을 장기 숙성시키면 좋을까? 가장 먼저 와인 자체의 힘이 좋아야 한다. 타닌, 산도, 당도, 맛의 강도 등이 그 오랜 세월을 거치고 나서도 힘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균형잡힌 맛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포도 품종 자체의 특성이나 해당 지역 "떼루아"의 힘, 혹은 빈티지에서 나올 것이다. 장기 숙성에 적합한 품종 중 대표적인 것이라면 리슬링, 카베르네 소비뇽 정도에다가 와인 중에는 샤토 디켐 같은 스위트 와인(스위트 와인도 무조건 당도만 높아서는 안된다. 당도에 걸맞는 산도가 있어야 최고의 스위트 와인이 나오는 법이다), 포트 같은 주정강화 와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버건디 피노 누아도 장기 숙성 와인으로 매우 유명하지만 이것은 버건디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 뉴질랜드 피노 누아는 보들보들하고 상콤한 맛 자체가 매력 아닌가. 요즘 아이가 태어나거나 기념할 만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그 해의 와인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 와인을 오픈했을 때 식초를 마시는 사태만은 피할 수 있는 안전빵 대책이 하나 있다. 1. 빈티지가 좋고 (아이가 태어난 해가 SHIT 빈티지였다면... 음... -_-) 2. 유명한 샤또에서 나온 (떼루아나 포도나무, 양조, 숙성 등에서 믿을만 하다.) 3. 프르미에 크뤼 (보르도 와인 중 가장 높은 등급) 4. 보르도 와인 (장기 숙성, 하면 그래도 보르도니까.) 을 구입하라는 말씀. 아, 마지막으로 와인을 자꾸 여기저기로 이동시키지 말고, 온도는 저온으로 일정하게, 뉘어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
|
 2008. 12. 3. 12:57 Trackback Comment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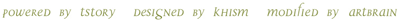
|
|




